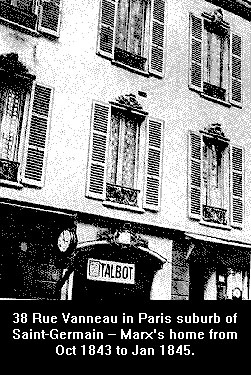
사유재산이 우리를 너무나 우둔하고 너무나 일면적이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가질 때, 따라서 대상이 우리에게 자본으로서 존재할 때 또는 우리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점유할 때, 먹고 마시고 우리 몸에 걸치고 그 안에 거주할 때 등, 간단히 말해서 사용할 때에야 비로소 대상은 우리의 것이 된다. 사유재산은 또다시 점유의 이 모든 직접적 실현들 자체를 생활 수단으로서만 파악하고, 이 실현이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생활은 사유재산의 생활, 노동과 자본화라해도.
그런 까닭에 모든 육체적 정신적 감각 대신에 모든 이러한 감각들의 단순한 소외, 소유의 감각이 등장하였다. 인간의 존재는 절대적 빈곤으로 환원되어 자신의 내면의 부를 자기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우리는 위에서 인간이 혈거 등으로 되돌아가지만, 소외된, 증오하는 형태를 띠고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동굴― 공평하게 야만인에게 향유와 보호를 제공해 주는 자연 요소 ―에 있는 야만인은 낯설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물속의 고기처럼 아늑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지하 주거는 적대적인 “낯선 힘을 가지고 있는 주거, 그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내줄 때에만 주어지는 주거”, 그가 자신의 고향― 나는 지금 여기 나의 집에 있다고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곳 ―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주거이거니와, 그 집안에서 오히려 그는 타인의 집, 낯선 집에 있는 것이요, 날마다 잠복해 있다가 그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날에는 언제든지 그를 내쫓고야 마는 타인의 집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주거가 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안의 주거, 부의 천국에나 있는 주거, 상주할 수 있는 인간적 주거와 대립함을 알고 있다.
소외는 나의 생활 수단이 타인의 생활 수단이라는 것, 나의 소원이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소유라는 것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사물들 자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 나의 활동이 타인의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본가에게도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인간적인 힘이 [지배한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K. Marx(1844), 강유원 옮김,『경제학, 철학 수고』 中
언젠가 카프카는 한 편지에서 “한 권의 책,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어버린 감성을 한 번에 휘저을 수 있는 책을 말한 것이지만, “머리에 주먹으로 일격을 가해서 각성을 시켜주는” 책은 감정 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고의 한계를 극한까지 몰아가는 글이어야 한다.
맑스의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는 그런 책이었다. 익히 안다고 생각했던 개념과 방법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준다. 소외(이후 물신성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대상화, 유적존재(아마 이 수고에서 가장 결정적인 개념), 활동과 노동, 경제와 정치의 분리, 부정, 이론과 실천의 분리로 대표되는 이원론과 맑스의 총체성, 추상과 구체의 방법론, 그리고 욕망... 이루 셀 수 없을 개념들의 모험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자본』에 이르기까지 명시하고 또는 숨겨놓은 고리들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런 저런 설명보다 위의 저 구절은 반지하와 옥탑에 사는 남한의 모든 세입자들의 심금을 울려줄 명언이라 하겠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 나에겐 생활의 수단이지만 다른 이에겐 재산의 증식이 되거나 수입원이 되는 곳, 활동과 그 결과물이 분리되어 어떻게 소외를 만드는지 어떻게 이처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아가 맑스는 이러한 물적 소외가 어떻게 우리들의 감각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한다. 지하의 혈거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적 감각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궁핍한 인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연극을 보더라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는 맑스의 말은 이론과 책에서 베껴낸 말이 아니다.
확실히 글은 그가 사는 만큼 써지고, 내가 사는 만큼 읽혀진다. 똑바로 살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