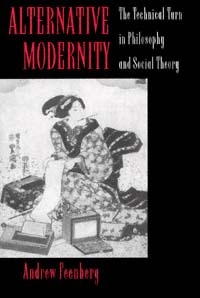
이론가들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추상적인 논의는 검증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유에서 ‘현학적’이라는 조롱을 받곤 한다. 이런 비아냥이 거슬리는 이론가가 “내가 못할 줄 알아!”라는 오기로 막상 현상분석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난관에 처한다. 이론의 핵심 개념들은 하나의 기호가 되고, 몇몇 기호들 사이의 차이에 걸맞게 분석대상이 되는 현실이 나누어진다.(‘기호학적 분석’은 흔히 이런 기호들의 체계를 현실에 투영하는 작업이다) 보다 쉽게 가려면, 하나의 모델이나 이행의 경로(path)를 약간 변형하면서 현실을 여기에 우겨 넣으면 된다. 이런 분석이야 말로 언젠가 마르크스가 말한 “현실이 텍스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현실로 들어가는”(Grundrisse) 지독한 관념론에 다름 아니다.
특히 대중문화를 이런 대상으로 삼을 때, 이런 곤혹스러움은 극에 달한다. 경제학이나 다른 ‘순수’(?) 학문들은 대중들이 잘 모르는 수치와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비교적 비판의 사거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니아와 평론가들이 난무하는 이 대중문화의 분석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다. 디-워(D-War) 해프닝이 보여주듯, 대중문화의 분석은 이론과 현실의 간극만을 확인시켜주기 십상이다.
대중문화의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불특정 다수의 ‘준’ 평론가들에게 노출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보다 대중문화를 이론과 모델로 ‘분석’하려는, 그래서 무지한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몰랐지?”라는 모멸감을 안기려는 이론가들의 자기확인에서 비롯된다. 바로 여기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지식인과 무지한 대중들의 위계가, 나아가 혁명의 시기에 경험했던 전위와 대중의 분리가 생겨난다.
핀버그(Andrew Feenberg 1995)의 <대안적 모더니티(Alternative Modernity)>의 한 장(chapter)은 이런 점에서 대중문화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그는 대중의 의식을 결코 이론가들이 분석해야 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object)으로 격하시키지 않는다. 50년대와 60년대의 SF, 디스토피아 혹은 스파이 영화, 광고 등의 대중문화는 이론가들이 세운 비판의 날 못지않은 대중들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투영되는 장으로 이해된다. 이 글의 한 제목이 보여주듯 비평(critics)은 대중문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도리어 대중문화 그 자체가 하나의 비평이 된다(Popular Culture as Critical Consciousness). 이 글에서 그가 택한 영화나 소설, 광고는 작가의 독특한 의도나 스타일의 뛰어남으로 선택되지는 않은 듯 보인다. 007시리즈가 그렇듯, 핀버그가 주목하는 대중문화의 테마들은 당시 충분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대중적’인 작품들이지 ‘예술적’ 작품들은 아니다.(사실 이런 구분 자체가 지극히 ‘현학적’이다.)
어쩌면 분석이란, 특히 대중문화에 있어 분석이란 대상과 대중들을 평가하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핀버그의 책 전체가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번역한 한 장(Chaper 3: Dystopia and Apocalypse)은 적어도 이론과 분석이란 “~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 안에서 그리고 ~을 통하여” 수행하는 작업임을 보여준다. 이 글이 오래 전에 쓰여졌음에도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면, 이전까지 도식화되었던 대중문화의 이론과 모델들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미덕,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ps: 위에 올린 번역파일은 거의 초벌번역 수준입니다. 함부로 가져가지 마시고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더라도 꼭 댓글에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로 쓸 요량으로 한 작업이니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으나 이후 다시 수정할 생각이니까요. 분량이 얼마 안되는 번역이지만 작업을 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은 외국어에 도통하여 얼마나 잘 옮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번역은 분명히 “글쓰기”입니다. 글이 안된다면, 그 난감함은 이를 데 없습니다. 갑자기 번역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지는 밤입니다.
 invalid-file
invalid-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