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7. 2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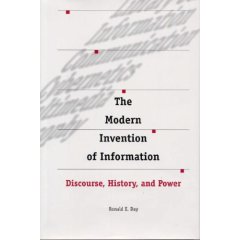
논문을 쓰다 보면 도지는 병 중 하나가 다른 주제에 눈을 돌리는 짓이다. 그다지 많이 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지겹다고 느끼게 되면, 새로운 영역이 훨씬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재미나 의미가 아니라면, “바로 지금 얘기해야만 한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해서라도 발병을 재촉한다.
몇 학기 반복되는 강의 내용만큼이나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에는 포함시키고야 말리라던 주제가 하나 있었다. 말로만 두루뭉실 넘어가거나 몇 문단의 메모로 때우던 글을 이틀 끄적이고 몇 장 완성하고 나니 병이 도졌다. 더군다나 근년 들어 사라지나 싶었던 ‘길거리 정치’를 보고 있노라니, 지난 총선의 46%라는 투표율로 “정치적 무관심”을 통탄하시던 그 똑똑하신 분들께 한 마디 하고 싶은 오만마저 생겼다.
그런데 이게 게으름인지, 아니면 다시 마음 다잡기인지 알 수 없으나 열 몇 페이지로 좀 확장해서 써 보려던 결심을 포기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비판해야 할 대상보다 내 작업이 더 급한 탓이다. 아쉬운 마음에 몇 자 끄적인 글을 올린다. 행여 내년 초에라도 좀 낫게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의 포기가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올해 말 끝내야 할 작업에 대한 결단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나 확실한 건, 또 하나를 미뤘다는 사실이다.
 invalid-file
invalid-file